뜻 : 삼연, 3연, 연연연, 然然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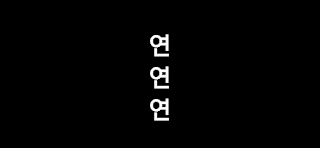
然然然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 그러하고 그러하고 그러하다. 우스개로 시작을 하자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연연연" 이라 하고는, 이어서, "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스승이 다시 말하였다. "1년(一年) 2년(二年) 3년(三年) 인가? ..." "이 년(해), 저 년(해), 그 년(해) 인가? ..." "이 년(녀자), 저 년(녀자), 그 년(녀자) 인가? ..." 여기서 말하는 연연연(然然然)은 1년 2년 3년이 아니고, 이년 저년 그년도 아닙니다. 연연연(然然然)은 '그러하고 그러하고 그러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글자이며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이라 하여도 되지 싶습니다. 우주만물과 인간세상의 리치(理致)를 꿰뚤어 훤히 알고 있는, 곧 얼이 아주 밝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말이고, 얼이 아주 밝은 사람도 짚어 헤아려 본 뒤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얼이 밝은 사람이 "연연연"이라 할 때, 무엇을 말하며 무슨 뜻인가를 알아 들으려면, 듣는 사람 역시 얼이 밝아야 합니다. 얼이 어둡거나, 아예 얼이 뜨버린 얼뜨기는, 아무리 자상하게 풀어서 일러주어도 상상할 수도,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연연연' 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하니,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얼을 밝히고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어도, "연연연"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사람의 길을 따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연연연' 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을 밝힌다면, 그 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블...










